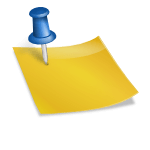국민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에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한 정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건희 씨가 발표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3편의 학술지 논문 모두 2008년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대 논문 규정 부칙 조항에 근거해 2012년 8월 31일 기점 이후 5년이 지났다는 논리다.그러나 국민대의 조사 결과가 황당한 이유가 있다. 본 규정 제17조에는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시효에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 이런 엄중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칙 조항에 무게를 두고 조사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국민대는 규정 하나로 조사 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두 달이나 걸렸다. 규정을 검토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예 조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간을 끌었다는 인상이 짙다.이번 조치에 대해 언론은 대선에 출마한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국민대가 면죄부를 줬다고 한다. 일부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김건희 씨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국민대가 검증을 포기함으로써 그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 셈이 될 수도 있다.국민대가 검증을 포기한 이유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만약 김건희 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이 난다면 이는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담당 지도교수들이 책임질 일이다. 이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서 대학 박사학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피하려 검증을 포기한 측면도 있다.사실 국민대는 과거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인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조사한 지 보름 만에 발표했다. 이 밖에도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로 재직할 때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은 시효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다. 대학의 학문적 지위를 위해서도 본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표절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한 교수들도 징계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 후 대학 차원에서 학위논문 심사를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자성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회적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국민대는 이런 것을 두려워해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결정을 내려 대학의 신뢰는 물론 모든 박사학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느낌이다.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_%EA%B2%80%EC%82%AC_%EC%8B%A4%ED%98%95%EA%B5%AC%ED%98%95_%ED%9B%84_%EB%B2%95%EC%A0%95_%EA%B5%AC%EC%86%8D%EB%A9%B4%ED%95%9C_%EC%82%AC%EB%A1%80-1.png?type=w800)